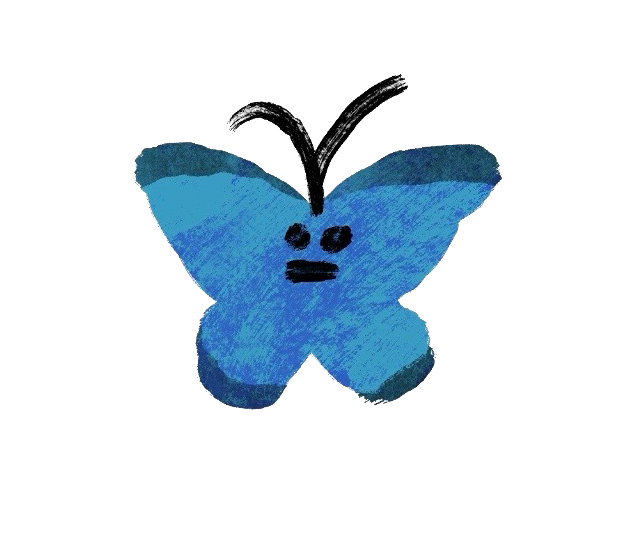부쩍, 그리고 무척이나 추워졌네. 집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멀다. 잠실대교 밑으로 넓게 뻗은 한강을 지나, 최고속도를 60에서 70으로 상향한 안내판을 지나, 나 역시 조금 더 달려보자는 다짐을 지나, 서울에서 경기로 넘어가는 알 수 없는 지점을 지나, 비슷한 느낌으로 한 시절을 지나온 내 얼굴이 창가에 어린다. 지금 눈을 감으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착과 종착을 구분하지 못했기에 멀어짐 역시 받아들이지 못하던 나를 꿈속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절의 나를, 이제는 끌어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 앞에 두면 따뜻하고 문학 앞에 두면 차가운, 그래서 더없이 미지근한 마음이다. 문학으로 현실을 데워보자던 마음은 증발한 것일까. 혹은 기름처럼 응고되어 어떤 가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함께 글을 쓰고 애통을 나누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아닌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 가 더 알맞은 질문이려나.
학과를 졸업한 지도 2년이 다 되어간다. 혼자 시작했지만 함께 끝낼 수 있었다는 소회로부터 나는 얼마나 멀어졌을까. 스터디와 동아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이것저것 주고받던 시간들이 이따금 그립다. 물론 그렇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애써 되돌아보지 않을 뿐이다.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굳이 상상해 보지 않을 뿐이다. 다만 그 시절 속에 정박해있던 친구들을 기억의 뭍으로 데려오고 싶은 밤이다. 학과에 관해 (특히 글로써) 주절거리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펜을 꺼내보는 건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을 내가 많이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예창작과에서 맺는 관계는 확실히 묘한 구석이 있다. 함께 문학하기로 결뉴한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 아닌가 싶다가도, 문학을 넘어 사회의 습작생 신분으로서 이따금 서러워지곤 하는 것이다. 제도를 비판하려면 제도에 편입해야 하고, 제도 바깥의 현실을 보기 위해 제도의 목마를 타야 하는 아이러니. 언젠가의 성공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 같아 조금 슬프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그런 식으로 작동되는 것 같진 않다. 구조와 논리 속에서 하루를 보낸 뒤, 행간과 서정을 찾아 터벅터벅 걸어가는 새벽. 행간에 숨어버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기승전결에 포함될 수 없는 마음을 껴안기 위해 글을 쓴다. 친구들 역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으리라 믿는다.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외로움을 겪어봤을 테니까. 그 외로움이 우리를 장력처럼 끌어당겼을 테니까.
어떤 외로움은 흐릿하지 않고 선명히 날선 모양.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좋은 연마제.
지난겨울, 신춘문예 투고를 위해 기록적인 폭설을 뚫고 우체국에 간 적이 있다. 안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이 지난한 빙판길을 걷고 있는 내 자신이 웃펐다. 그러다 절대 아님에 서 있던 나를 보통으로 이끌어주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길을 뚫고 우체국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그보다 더한 계절을 함께 건너봤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을 더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대신 우리의 글이 책방에서 만나겠지. 첫 증명사진의 어색함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나란히 같은 곳을 바라보겠지. 우리를 읽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야기를 내보일 마음으로 말이야.

- 글과 사진 윤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