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을 강조해서 ‘빠’라고 부르듯, 이건 아빠에게 전하는 팬레터
§
오랜만에 김명기 시인의 ‘목수’라는 시를 읽어 본다. 첫 대가리만 때려 보면 단박에 들어갈 놈인지, 굽어져 뽑혀 나올 놈인지 안다는 화자의 말이 여전히 굳건하다. 그 단언이 가슴 깊숙이 박혔던 2022년 봄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시를 읽고 처음으로 아빠에 관한 시와 소설을 썼던 기억 역시 선연하다. 아빠도 목수였으니까. 김명기 시인의 시에서 목수는 너무 쓸쓸한 존재였으니까.
언젠가 아빠를 따라 현장을 갔던 적이 있었다. 시공 전의 공간이 얼마나 춥고 허약한지, 외로움이 얼마나 가시적인 감정인지 나는 그때 알게 됐다. 그렇기에 목수의 단단함은 이름에 들어찬 나무 때문이 아닌, 내부의 빈약함을 아는 마음이 굳어진 이유일 테다. 어쩌면 목수는 목격자의 또 다른 이름. 목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설프게 쌓고 쉽게 부서지는 사람들에게 도면을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을 문학이라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믿음 속에서 나는 시를 썼다. 과제용 시였지만, 과제란 숫제 하기 싫은 것이지만, 그날만큼은 해야만 하는 것으로 과제를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문학을 완성해야만 했다.
§
영화 <파니 핑크> 속 Fanny Fink는 본인이 만든 관 속에서 잠을 청한다. 그 장면을 보며 문득 당신 생각이 났다. 언젠가 당신의 나무도 삶보다 죽음을 재단하는 것이 어울릴 때가 오겠지. 그때를 위해 나 역시 관(館)을 만들고 있다. 아무렴 당신은 영화를 많이 좋아했으니까.
어릴 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는 OCN이나 Screen 같은 TV채널로 영화를 보곤 했다. 그러다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 내 의문은 여기서 시작됐다. 아빠는 편성표에 맞춰 채널을 찾는 것이 아닌, 채널을 돌리다가 괜찮은 영화다 싶으면 그때부터 봤다. 그러니 영화의 도입을 모조리 놓치거나, 아예 2부부터 영화를 볼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아빠는 영화가 결말에 이르면 여지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뭐, 평범한 갱년기 증상일지도 몰랐지만… 나는 아빠의 슬픔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문학은 그런 내게 원목 책장을 던져줬다. 반쯤 기울어진 사선형 원목 책장. 제 몸보다 무거운 책이라도 업은 듯, 똑바로 일어서질 못하고 점점 고꾸라지던 책장. 지지대의 벌어진 틈으로 다 읽은 책들을 끼워 넣으며 연명하던 나날들. 책을 보호하기 위해 책을 소모하는 꼴이 웃기지만, 책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내 잘못이 컸다. 책장을 등판에 결합할 때 세 개의 구멍이 메워져야 하는데 나사 하나를 빼먹고 조립했다. 그때 생긴 공백이 품을 키워나가더니 기어코 책장의 허리를 분지른 것이다.
이런 책장의 고비는 어쩐지 당신의 몸과 나의 걱정을 닮았다. 술이 들어갈수록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당신의 몸과, 이렇게 자면 허리 나빠져요- 어떻게든 당신을 침대에 눕히던 나의 두 손. 이 손으로 계속 글을 써도 되는 것일까, 자조하던 어느 새벽. 위태로운 내 책장의 지지대가 다 읽은 책이듯, 문학이 나를 힘들게 해도 결국엔 나를 일으켜줄 수 있을까. 내가 지나온 문학이 나를 버티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곤히 잠든 아빠의 얼굴을 바라봤다.
당신이 보려던 영화는 언제나 중간부터 시작됐고, 나 역시 당신 인생의 중년부터 목격한 사람. 당신이 만들어둔 도입부를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신의 결말을 마주한다면 많이 슬플 거라는 예감. 그 예감만은 확실했다. 그러니 벌써 슬퍼하지 말기로. 과거를 복기할 수 없다면 당신과 새로운 바둑을 두면 되는 것이다. 흑돌과 백돌로 수놓인 바둑판을 한 장의 흑백사진으로, 한 편의 무성 영화로 추억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언젠가 극장에서 만나요. 암전을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극장에서 같이 춤춰요.
- 글과 사진 윤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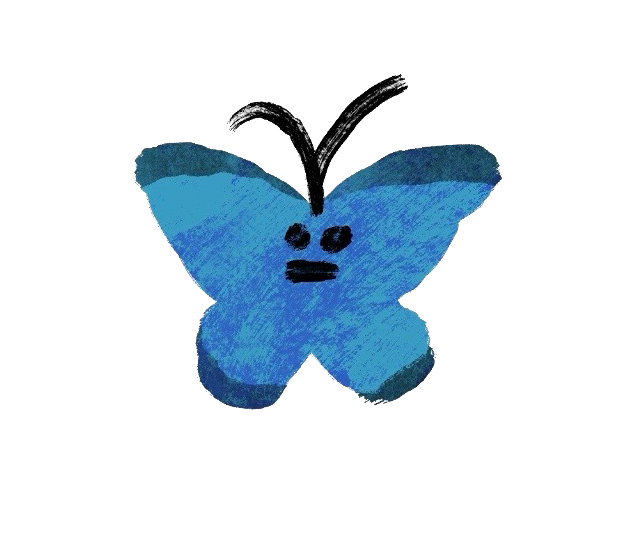

못 주머니를 찬 사람이 떨어졌다
낮달과 해 사이 그가 쳐 대던 못처럼 박혔다
점심을 나와 함께 먹었던 사람
맞물리지 않은 비계에 발을 헛딛고
허공에서 바닥으로 느닷없이 떨어졌다
짧은 절명의 순간에도 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안전모가 튕겨져 나가고 박히지 않은 못이 먼저 쏟아졌다
세상 한 귀퉁이에서 이름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낡은 안전화를 끌고 날마다 비계를 오르던
늙은 목수가 남긴 유산이라곤 허름한 못 주머니와
상처투성이인 안전모와 조악한 싸구려 안전화가 전부였다
자기 전부를 걸고 일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필사적이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급차가 달려올 때 마디 굵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서려던 사람이 끝내 숨을 거두고
현장은 서둘러 정리되었다 장국에 말은 밥을
크게 한술 뜨며 했던 그의 말이 자꾸만 거슬렸다
못질할 때 말이여 첫 대가리만 때려보면 알어
단박에 들어갈 놈인지 굽어져 뽑혀 나올 놈인지
낮달과 해 사이에 박혀버린 그는 어떤 못이었을까김명기, <목수>
계간 열린시학,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