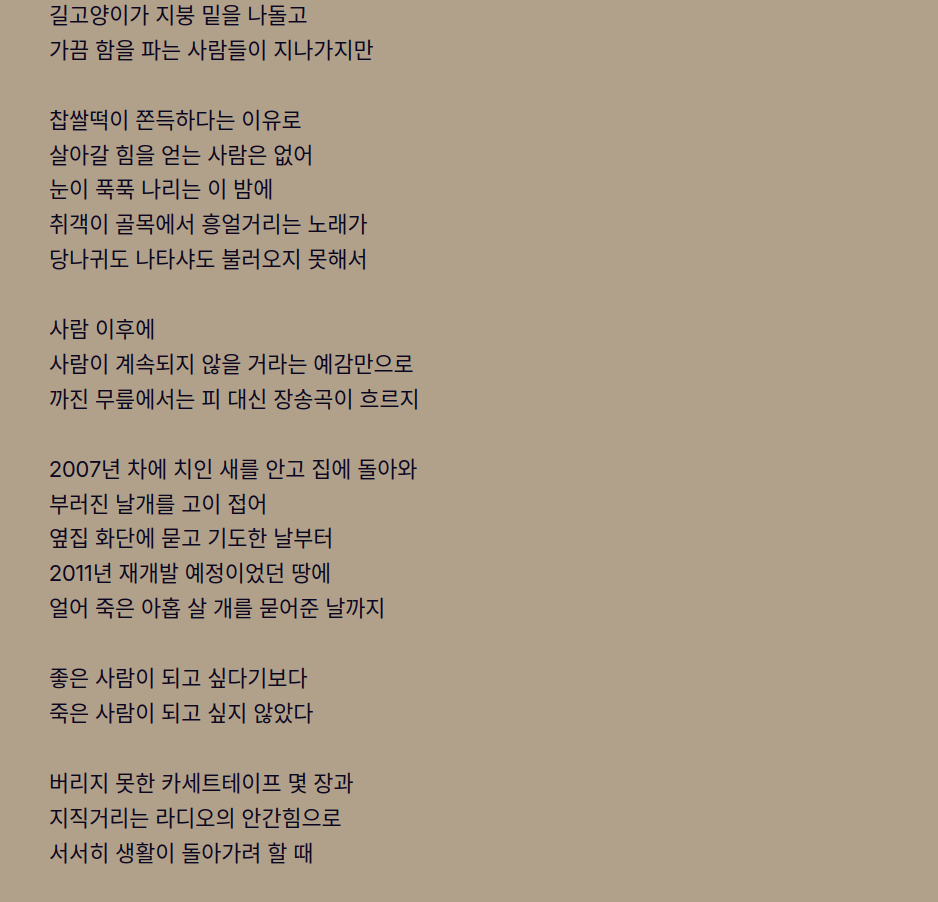1999년 나를 업고 마을을 쏘다니던 당신이
돌부리도 없이 땅바닥에 엎어진 날부터
죽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밤이면
동그랗게 솟은 것들이 전부 무덤으로 보이지
내가 사는 곳에는 언덕이 많고
길고양이가 지붕 밑을 나돌고
가끔 함을 파는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찹쌀떡이 쫀득하다는 이유로
살아갈 힘을 얻는 사람은 없어
눈이 푹푹 나리는 이 밤에
취객이 골목에서 흥얼거리는 노래가
당나귀도 나타샤도 불러오지 못해서
사람 이후에
사람이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예감만으로
까진 무릎에서는 피 대신 장송곡이 흐르지
2007년 차에 치인 새를 안고 집에 돌아와
부러진 날개를 고이 접어
옆집 화단에 묻고 기도한 날부터
2011년 재개발 예정이었던 땅에
얼어 죽은 아홉 살 개를 묻어준 날까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기보다
죽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버리지 못한 카세트테이프 몇 장과
지직거리는 라디오의 안간힘으로
서서히 생활이 돌아가려 할 때
상처를 알아채기 전까진 아픔을 몰라서 눈물을 흘리기 전까진
내가 가진 건조함을 알 수 없어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듣고 있었다
아파트가 들어선 언덕을 지나
웃고 있는 눈사람들 너머
들짐승이 파헤쳤다는 땅 앞에서
내가 사는 곳에는 가로등이 많고
가끔 우는 아이가 지나가고
빗질을 하고 거울을 보며
이제야 좀 산 사람 같다는 당신의 말을
느리게 되짚으며 묻지
잘 있어?
밥은?
- 시인 장대성

‘아니리’는 판소리의 한 대목에서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 장단 없이 이야기를 풀어 엮는 행위를 뜻한다. 자유로운 이야기에 솔직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내 지난날을 풀어내고 나면 일순간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쓰게 된 시이다. 너무 어린 시절이라 기억에도 남지 않은, 그러나 이야기로 종종 들어온 사람을 추억하고 안부를 묻는 일, 그것으로부터 현재의 나를 되짚어보는 일이 내게는 용기고 솔직함이었다. 한 사람에게 향하는 작은 물음이 사라져가는 세상에서, 내가 묻고 싶은 건 사소한 생활이었다. 밥은 먹었어? 같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금세 숨이 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