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식당에서 나왔을 땐
일곱 시 정도
몇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개망초 흰 꽃잎이 난분분한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면
대충 반으로 나눠 먹던 호빵처럼
두 쪽으로 찢어진 구름 사이에
어둠이 들어차는 중이고
나는 알게 모르게
좋아지는 중이야
여름 하늘에서 가뿐히 호빵을 발견하듯
네가 숨겨둔 슬픔도 알아챘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종로는 여전히 골목이 많네
내가 가진 골목과 네가 가진 골목을
접해서 만든 귀퉁이 위에 나는 서 있어
이야기로 빼곡한 책 안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폭우가 서서히 잦아들던 이른 아침
창밖으로 함께 바라본 한 사람을 기억해?
꽃잎처럼 흩어진 돌을 그러모으던 사람을
돌담이 무너졌나 봐, 나는 말했고
죽은 사람을 묻어주려나 봐, 너는 말했지
격동의 차이였을지도 몰라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제멋대로 뛰는 여름의 맥박을
각자에게 필요한 문장으로 짚었을 뿐일지도
여기서 더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려고 해
골목은 어두워질수록
기습적인 공간이 되니까
갑자기 보고 싶어지는 건 재미없으니까
여름은 내가 자신했던 지구력에
실망하기 좋은 계절
그래도 나는 길게 슬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 시인 윤병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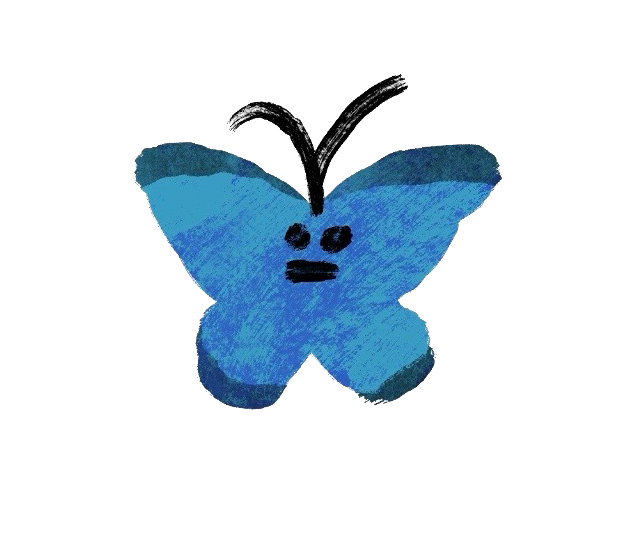
8월의 8은 여름이 몰래 만들어둔 눈사람 같다. 나는 괜찮게 지내는 중이야, 말하고 싶었던 이번 시도 어쩌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르겠다. 여름과 겨울처럼 진부한 반대말이 되어버린 관계를 떠올려본다. 언제나, 라는 외침이 언젠가, 라는 마음으로 묽어지는 게 이별인가. 시절의 귀퉁이를 접을 때 그것은 기억에 가깝나 훼손에 가깝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