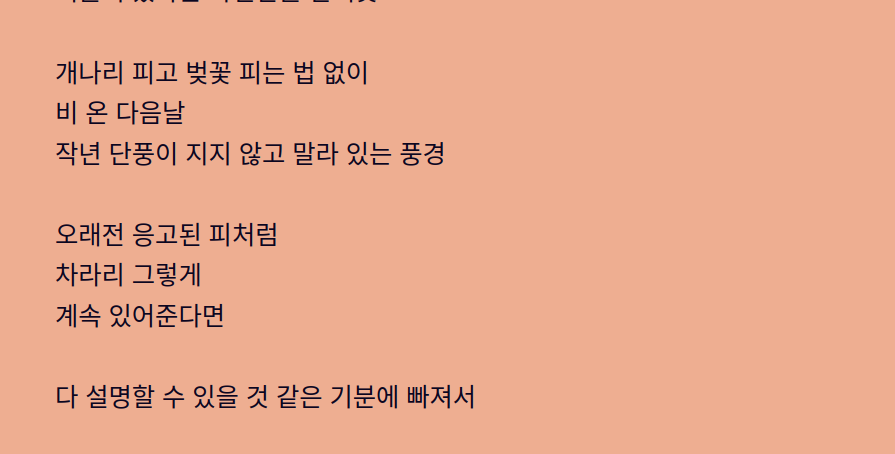봄
어깨에 두른 외투를 떨어뜨린 사람
여름
민소매 원피스를 고르는 사람
그날 다 봤다
고가 아래
두껍게 껴입고 사는
길사람
기지개 켜고
아침에 몇 번
솜주먹으로 내리치다 만 겨드랑이 생각이 났다
너와 나의 림프절
우리들의 대관절
길길이 길이길이
날뛰며 꺼지는 법 없이
오늘도 사람 많은 길을 걸었다
유럽 같아?
CD 있어요?
신이 한국인이야?
사진 찍어주던 사람에게
멀리 농성 소리
가까이 연주 마친 사람에게
그렇다고 믿고 있을 사람에게
사람 말을 받아와서 적는데 왜 힘이 들어?
사람이
내가 나에게 묻기를
이제 세상은 분명한 하나에 요동칠 뿐이다
겨울이 갔다는 사실만을 알리듯
개나리 피고 벚꽃 피는 법 없이
비 온 다음날
작년 단풍이 지지 않고 말라 있는 풍경
오래전 응고된 피처럼
차라리 그렇게
계속 있어준다면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에 빠져서
덕수궁 석어당 옆
사백 년쯤 꼬아 만든 동아줄 같은 살구나무 기둥을
몇 번 더 보러 가겠지
월화수목금토일
정말 다 볼 수 있는 날 손꼽아 기다리려고
단풍은 손모양
한 주씩 세기 좋은 일곱 개 손가락
바람에 말라죽을 때도 다 접히는 기적이 있다
기적은 보통 부적이 아니어서
남들 모르게 잘 지니고 다녀야 한다
- 시인 김민지
자생. 아름다움. 초연함. 지니고 싶은 건 언제나 주머니를 가질 수 없는 손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게 정말 달려 있었을까. 운명이 노력에만 달려 있었을까. 애써 잘되지 않아 다행이었다 말하기까지는 긴 시간 들 일이다. 400여 년 봄을 맞은 살구나무 앞이었다.